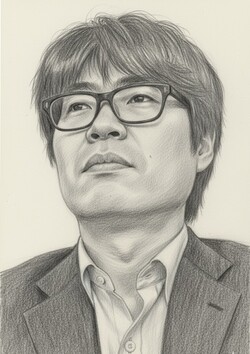
실손보험 분쟁은 더 이상 특정 사례나 일부 소비자의 불만으로 치부할 단계가 아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가입한 보편적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7,500건 이상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도수치료·백내장·무릎주사 등 비급여 3대 쟁점이 전체 분쟁의 절반을 넘긴 현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 메세지를 보냈지만 시장은 사실상 방치돼 왔다.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을 ‘뿌리부터 뜯어고칠’ 전면 구조 개편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실손보험의 문제는 현장에서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해석 충돌에 있다.
포괄적 약관, 치료 범위에 대한 지나치게 넓은 해석 여지, 의료기관의 비급여 확대 전략, 소비자의 과잉의료 의존.
이 모든 요소가 뒤엉켜 시장은 왜곡됐고, 보험사는 방어적으로 변했으며, 소비자는 분쟁으로 떠밀렸다. 불완전한 구조 안에서 ‘누가 더 많은 것을 챙기느냐’의 소모적 대립이 이어져 온 셈이다.
금감원이 올해 처리한 6,299건의 분쟁 중 약 40%를 소비자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도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소비자는 사후 구제에 의존해야 했고, 보험사는 선제적 관리보다는 방어적 운영으로 일관했다. 그 사이 의료자원은 비급여 중심으로 쏠렸고, 도덕적 해이는 시장의 기본 질서를 흔들었다.
이제라도 금감원이 ‘사후 처리’가 아닌 ‘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은 것은 반가운 일이다.
소비자가 치료 전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창구 신설, 비급여 분쟁 항목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중증·보편적 의료비 중심의 상품 재편 등은 방향 자체로는 타당하다.
특히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외래 자기부담률을 조정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보장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은 그동안 불균형적으로 확대된 비급여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의료자문 절차의 손질이다.
보험금 지급 거절의 ‘만능 도구’처럼 활용돼 온 의료자문은 소비자의 불신을 키운 대표적 요소였다.
금감원이 자문인의 소속·전문의 여부 등 기본 정보를 표준화해 공개하고, 공정성 확보를 감독하겠다는 것은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다.
불합리한 합의 유도나 부당한 보험금 삭감에 대해 ‘무관용’을 선언한 것 역시 제도 신뢰 회복의 최소 전제다.
그러나 이번 개편 방향이 실제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의 대립 구조를 줄이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정책의 일관성이다.
보장 축소는 언제나 반발을 낳는다. 각 이익집단의 의견 충돌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재의 실손보험은 이미 지속 가능성의 문턱을 넘어선 구조다. 상품 재설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균열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경보 장치’와 같다.
그동안 반복된 분쟁과 시장 왜곡은 경보가 울리고 있었음에도 누구도 근본 원인을 손대지 않았던 결과다.
이번 금감원의 개편이 단순한 ‘또 하나의 개선안’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실손보험은 더 이상 땜질식 대책으로 버틸 수 없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신뢰도, 가입자 보호도 모두 무너질 수 있다.
정책 당국의 단호함과 시장 참여자 모두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