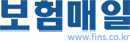세계 재보험 시장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145년 역사의 글로벌 재보험사 뮤니크리(Munich Re) 이사회 멤버 슈테판 골링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헤지펀드와 패밀리 오피스 등 민간 자본의 급격한 진입이 전통적인 재보험 구조를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가 지적한 문제의식은 단순히 글로벌 시장만의 이슈가 아니다. 기후위기와 재해 빈발로 리스크 관리에 직면한 국내 보험업계에도 직접적 함의를 던진다.
전통적으로 재보험은 ‘보험사의 보험’으로 불리며 수 세기 동안 대형 재난에 대한 안정적 보장 구조를 형성해왔다.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 뉴욕의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같은 헤지펀드, 전문 사모펀드 매니저들이 잇따라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에이온(Aon)에 따르면 대체자본 규모는 2022년 930억 달러에서 2024년 말 1,15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 상반기 1,210억 달러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진다.
재난채권(cat bonds)과 사이드카(sidecar)라는 새로운 투자수단이 전통적인 보험·재보험사들과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자본 공급원은 다변화되었지만 동시에 리스크 전가 방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신규 자본이 통계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초대형 허리케인, 메가 지진 등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하지만 골링은 일부 신규 자본이 통계적으로 드문 초대형 재난층에 집중하고 우박 등 빈발 리스크에는 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험시장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장 공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허리케인 이안(Ian)이 플로리다를 강타했을 때, 민간 자본의 철수로 재보험 시장이 크게 흔들린 사례가 보고됐다.
이로 인해 일부 최상위 재보험의 가용성 자체가 위협받으며, 전통적 재보험사와 민간 자본 모두 가격을 급등시켰다.
이런 흐름은 국내 보험업계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최근 우리나라는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기후위기 재난이 잦아지며 손해보험사의 대형 손실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미 2020년대 초반 태풍 ‘힌남노’ 사례에서 보듯,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단기간에 보험사의 손익을 뒤흔든 바 있다. 이러한 손실을 흡수해 줄 재보험 시장이 변동성에 휘둘린다면, 1차 보험사인 국내 손보사들의 재무 건전성은 더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내 보험업계가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재보험 가격의 급등’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민간 자본의 유입과 철수가 반복되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내 보험사들의 재보험 비용도 덩달아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자동차·화재·재난보험 등 소비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보험산업 전반의 사회적 책임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즉, 단순히 글로벌 금융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보험료 수준까지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다.
‘위험 인식의 불균형’도 살펴야 한다. 민간 자본이 초대형 재난에만 집중하듯, 국내 보험사들 또한 단기적 손익을 고려해 빈번한 생활형 위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 체감 리스크는 오히려 폭염, 집중호우, 화재와 같은 일상적 재해에서 발생한다. 재보험 시장의 변화가 이 간극을 확대한다면, 국내 보험사들이 직면할 사회적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따라서 국내 보험사들은 단순히 글로벌 재보험 가격을 전가하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후위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위험모델링을 강화하고, 일정 부분은 자체 준비금과 위험관리 역량을 통해 충격 흡수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와 감독당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민간 자본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공적 재보험 제도나 정책보험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형 ‘재난 리스크 풀(Pool)’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ESG 경영도 기후리스크를 단순한 비용 요인이 아닌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