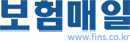보험산업은 단순히 ‘위험을 보장하는 사업’을 넘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최근 미국 보험 데이터 솔루션 회사인 지웨이브(ZYWAVE)가 분석한 ‘위험 가속의 시대, 대응 전략 2025’(Navigating the Escalating Risk Trajectory 2025) 보고서는 이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핵심 메시지는 분명하다. 위험은 단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속화되고 있으며,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그림자
AI는 금융, 제조, 의료 등 모든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의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보험의 시각에서 보면, AI는 또 다른 불확실성의 원천이다. 알고리즘 편향, 데이터 오류, 자율주행차 사고, 그리고 최근 급증하는 AI 기반 사이버 공격까지, AI는 이제 위험의 ‘촉매제’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와 초개인화 피싱 공격은 기존 보안 체계로는 막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한 차원의 위험이 아니라, 기존 리스크와 중첩되며 피해 규모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우는 성격이 문제다.
기후 리스크는 더 이상 미래의 가정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2024년에만 10억 달러 이상 피해를 낳은 기후 재난이 27건 발생했다.
산불·홍수·허리케인 같은 극한재해는 매년 보험손실을 1000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플로리다·캘리포니아 같은 고위험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 여기에 환경 책임 소송의 확산은 기업 리스크를 한층 증폭시킨다. 올해 초 셰브론(Chevron)이 7억5천만 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은 사건은 ‘탄소 책임’이 단순한 사회적 논쟁을 넘어 법적·재무적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내 기업에도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구조 변화와 무형의 손실
코로나19 이후 자리잡은 원격(재택)근무의 확산은 전통적인 고용보험·산재보험 틀을 흔들고 있다. 근로자가 더 이상 동일한 공간, 동일한 시간에 모여 일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사고와 정신건강 문제는 새로운 보험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동시에 소비자·사회는 기업의 노동·환경 관행에 대해 더 큰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한다. ESG를 소홀히 할 경우, 단순한 평판 리스크를 넘어 규제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글로벌 보험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소송위험(Litigation Risk)이다. 집단소송은 개인정보 보호·생체정보·제품책임 영역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PFAS(영원한 화학물질) 소송은 지난해에만 110억 달러 규모 합의로 이어졌다.
여기에 배상액 1천만 달러 이상인 ‘핵 평결’(Nuclear Verdict) 사건은 2024년에 200건 이상 발생, 평균 배상액이 7,500만 달러에 달한다. 소송 자금조달 시장의 확대는 소송을 더 길고, 더 비싸게 만들고 있다. 결국 이는 보험사 언더라이팅 비용 증가, 나아가 전 세계 기업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된다.
사회적 인플레이션과 손실 비용 증가
보험산업의 근본적 위협은 ‘사회적 인플레이션(Social Inflation)’이다. 사회가 기업과 보험사에 더 많은 책임을 묻고, 배상액은 커지고 있다. 2012년 250만 달러였던 100만 달러 이상 손해의 중위값은 2024년 600만 달러로 치솟았다.
여기에 공급망 붕괴, 사이버 사고에 따른 영업중단 손실은 보험의 전통적 범위를 넘어선다. 2024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CrowdStrike) 보안사고는 글로벌 포춘500 기업 매출 손실만 54억 달러에 달했다.
이같은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에 대해 지웨이브는 데이터 기반 언더라이팅 혁신, 중개사의 역할 강화, 기업의 리스크 관리 통합을 강조한다.
한국 보험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기후재해의 증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ESG 규제 확대라는 동일한 파도가 이미 닥쳐오고 있다. 특히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국내 보험산업은 이번 보고서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