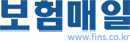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백화점업계는 매출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슈퍼 VIP' 고객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객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자, 등급 기준을 높이고 전용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소수 정예' 관리에 나섰다.
◇ 롯데·신세계·현대…VIP 문턱 더 높이고 혜택은 더 두텁게
롯데백화점은 올해 들어 VIP 프로그램인 ‘에비뉴엘’ 제도를 개편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에비뉴엘 블랙’ 등급으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인원수를 올해부터 연간 구매 금액 상위 777명으로 제한하며 '상징성'을 부여했다.
이외에도 기존 에메랄드 등급 기준은 1억 원에서 1억2천만 원으로, 오렌지는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새롭게 ‘사파이어’ 등급(8천만 원 이상)도 신설해 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나눴다.
신세계백화점도 지난해 VIP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봤다.
최상위 등급인 ‘트리니티’는 999명으로 제한하고, 1억2천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을 위한 ‘블랙 다이아몬드’ 등급을 신설했다.
기존 등급들도 기준 금액이 일제히 높아졌다.
다이아몬드는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플래티넘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골드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개편이다.
현대백화점도 VIP 고객 기준을 2023년에 이어 또다시 상향 조정했다.
최상위 등급 ‘쟈스민 블랙’은 1억2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그 하위 등급들도 줄줄이 올랐다.
◇ 맞춤형 서비스·전용 라운지…혜택도 한층 고급화
단순히 기준만 올린 것이 아니다. 혜택 경쟁도 동시에 치열해졌다.
롯데백화점은 잠실점과 본점의 VIP 전용 라운지를 리뉴얼했고, 내년부터 에비뉴엘 블랙 등급 고객을 대상으로 커스터마이징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은 미쉐린 셰프와 협업한 고급 미식 프로그램 ‘파인다이닝’을 도입하고, VIP 전용 라운지를 점포별로 확장했다. 현대백화점 역시 주차·쿠폰·라운지 외에 등급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 중이다.
◇ VIP 매출 비중, 벌써 50% 육박…불황 속 충성고객 사수 총력
이처럼 업계가 우수고객에 집중하는 이유는 ‘실적’ 때문이다.
롯데백화점의 VIP 고객 매출 비중은 2020년 35%에서 지난해 45%로 상승했고, 신세계는 같은 기간 31%에서 45%로, 현대는 38%에서 43%로 올랐다.
갤러리아백화점은 2023년 기준 VIP 매출 비중이 51%로, 전체 고객 중 절반 이상이 소수 VIP에 의존하는 셈이다.
특히 경기침체기에는 일반 소비자의 구매력은 감소해도 VIP 고객의 소비는 거의 흔들리지 않는 점이 주요 전략 배경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고객 기반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VIP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충성 고객을 장기적으로 붙들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